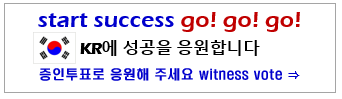숫자에는
친구 1,238명.
갑자기 페이스북 첫 페이지에 쓰여 있는 1238이라는 숫자가 1234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1234. 이 깔끔하고 간결한 숫자를 갖고 싶다. 4만 빼내면 된다.
친구 목록을 쭉 훑어보았다. 밑으로 내려 갈수록 소통이 없거나 뜸한 페친들 계정이 뜨니까 그 근처에서 골라내면 되겠지. 페이스북 알고리듬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천 명이 넘는 페친 중 피드에 보이는 페친은 오십 명도 채 안 된다. 네 명이 아니라 천 명을 삭제해도 내 온라인 삶에는 거의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아예 123명으로 줄이는 것도 좋겠다. 1234보다 123이란 숫자가 더 멋지다.
이 사람은 누구지. 낯선 이름과 별칭 뒤에 있는 페친들의 정보를 한 명씩 확인하니 슬슬 이들이 ‘목록‘이나 ‘숫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계정만 남고 몇 년 동안 사용한 흔적이 없는 페이지들도 많이 보인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다. 쓸데없는 이 짓을 멈췄다. 그깟 ‘1234’가 뭐라고. 저절로 줄겠지.
_
정확히 15년 전 2010년 4월 25일, 페이스북에 처음 가입했다. (예전에 기록해 둔 메모가 남아있다) 초기에는 페친이 늘어나는 과정 자체가 게임처럼 재미있었다. 친구 숫자는 게임 점수 같았다.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가리지 않고 다 받았다. 페친 5,000명을 꽉 채우면 나를 (나의 작업을) 알리기에도 좋겠다고 생각했다. 5000이라는 숫자는 수집욕을 자극했다.
얼마 전 고어 슬래셔 영화 ‘콜렉터(2009)’를 보았다. 영화 속 살인마는 인간을 곤충 채집하듯 수집하는 걸 즐긴다. 살인마는 인간을 인격이 없는 사물처럼 취급한다. 그 장면에서 페친의 숫자에 잠시나마 집착했던 내 모습이 겹쳐졌다.
1238 이 숫자에는 인격이 담겨 있지 않다. 이 숫자 속의 사람들이 고양이와 함께 사는지, 매일 아침 산책하는지, 시끌벅적한 파티보다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을 좋아하는지, 1238에는 그런 히스토리가 없다. 히스토리가 감춰진 온라인 인간들은 가면을 쓴 ‘콜렉터’의 연쇄살인마처럼 마음껏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 덕에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직접 마주 대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본성을 알게 될 때도 있다. ‘우리’는 (이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소셜미디어에서 서로의 인격(히스토리)이 제거된 상태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소통하지만 소통하지 못하는 작위적 연결.
_
덧. ‘콜렉터’ 스포일러.
나중에 밝혀진 연쇄살인마 콜렉터의 정체는 멀쩡한 학자(지식인)이었습니다. 당시 영화 속에서는 일종의 반전 같은 것이었지만, 영화보다 현실이 더 기괴한 요즘에는 그 ‘반전’이 꽤 리얼하게 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지식인’을 소셜미디어에서 직접 확인한 적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