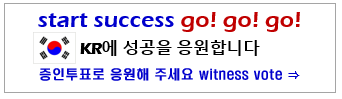순전히
너무나도 순수하고 완전하게 즐거워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밀려 나온 커다란 웃음을 터트렸던 적이 언제였을까. 까마득한 안개처럼 희뿌연 기억 속을 헤집어 억지로 그날을 떠올렸다. 분명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여전히 ‘초등학교’라는 단어는 어색하다.)
오렌지빛 햇살이 따스하게 쏟아지던 화창한 봄날이었다. 하지만 건조한 공기 때문에 국민학교 운동장을 걸어갈 때 하교하는 아이들의 발에 차여 피어오른 텁텁하고 짠내 나는 흙먼지가 입에 씹히기도 했다. 결이 맞는 아이들 대여섯 명과 함께 교문으로 걸어 나갔다.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서로의 뒤를 잡는 놀이를 하며 다들 까르르 웃어 대었다. 그 웃음은 꼭 참을 수 없는 재채기 같았다. 너무나 즐거웠다. 정말이지 다시 그때처럼 웃을 수만 있다면, 그때처럼 순전하게 즐거울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웃으며 서로 뒤를 쫓다가 한 아이가 내 양 옆구리를 껴안듯 잡았다. 순간 내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가면서 시간이 멈췄다. 물론 내 웃음도 함께 끊어졌다. 권신. 그 아이의 이름이다. 하얗고 깨끗한 얼굴에 약간은 새초롬한 아이였다. 나이에 비해 성숙했고 공부도 잘했다. 얼굴 이목구비는 뿌옇지만 그 이름은 아직도 뚜렷하게 내 머릿속에 새겨져 있다. 이성을 향한 묘한 감정을 처음 알게 된 날도 그날이었다.
_
공강 시간에 다음 강의 준비도 할 겸 교내 카페 구석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갑자기 한 여학생의 웃음소리가 카페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다. 1층 로비를 개조한 곳이라 꽤 공간이 컸다. 저 멀리 학생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고, 그중 한 여학생이 다른 학생의 말 한마디에 강박적으로 반응하며 반복해서 웃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날을 떠올렸다. 하지만 왠지 저 여학생의 웃음소리는 즐겁다고 느껴지지 않았다.